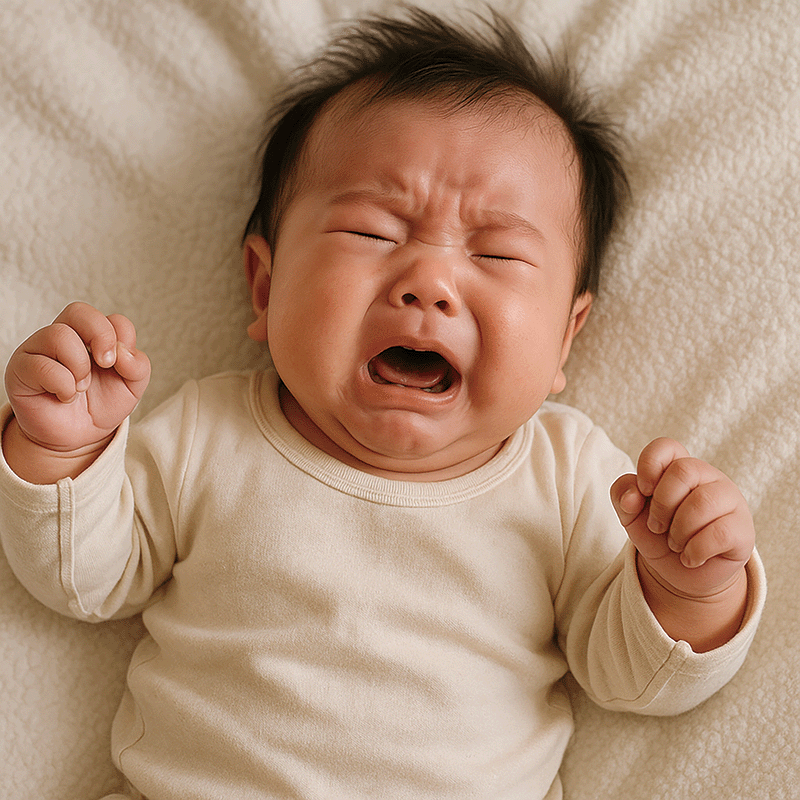
대체 '백일의 기적'이란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 밤에 통잠을 자게 된다는 약속의 날을 기다렸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도 아이는 새벽에 잠을 깬다. 육아 선배들은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위로하지만 퀭한 눈빛으로 생활하는 부부 입장에선 죽을 맛이다. 해법을 찾으려 맘카페나 블로그 같은 곳을 찾아봐도 명확한 해답은 없고, 되레 혼란만 생긴다. 어떤 맘은 '울어도 독하게 마음먹고 내버려 둬야 한다'라고 조언하는데 또 다른 맘은 '아이가 원하는 만큼 안아주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좋다'는 소리를 한다. 유튜브나 육아 지침서도 다를 바는 없다. 아기들은 왜 이렇게 밤잠을 설치는 걸까? 어쩌면 최근 미국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연구팀에서 낸 논문이 답이 될지도 모른다. 아이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모유 때문일 수 있다는 거다.
아이의 미숙한 일주기 조절
사람이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 몸에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조절하는 주된 호르몬은 두 가지다. 첫째, 사람의 각성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졌지만 본래 기능은 인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각성시키는 역할이다. 인체에는 이른 아침부터 서서히 코르티솔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해 오전 6시에서 8시 정도에 최고 농도로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기상하게끔 안배된 장치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늦은 밤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자야 할 시간에 코트리솔이 분비되어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든다.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주로 이렇게 생기기에, 불면증에 처방되는 수면제들은 코르티솔과 반대작용을 하는 약이 많다.
아침에 잠을 깨우는 호르몬이 있다면, 반대로 밤에 입면(入眠)하게 만드는 호르몬도 있을 테다. 사람이 밤에 잠을 자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다. 일반인에겐 생소한 이름일 수 있으나 해외여행이나 해외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바뀐 시차(時差)에 적응하기 위해 밤 시간대에 멜라토닌을 알약 형태로 먹는 일이 잦다.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지면 몸이 그 시간대를 밤으로 인식해 일주기가 다시 조절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절이 가능한 이유는 멜라토닌 분비가 빛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밝은 낮에는 빛에 의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어두운 밤에는 빛이 없어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된다. 늦은 밤에 밝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멜라토닌 분비에 교란을 일으켜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의 자연스러운 수면 조절은 뇌가 충분히 자란 아동기에나 작동되기 시작한다. 사람으로 발달하고 있는 아기에겐 그런 역량이 없기에 밤에 잠을 잔다는 개념이 옅다.
집에서 먹고 자는 일을 반복하는 영아에게야 그리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부모는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하는 일주기 리듬이 자리 잡은 성인이다. 밤낮없이 먹고 자는 아이를 돌보는 게 고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면 교육이 도입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드물다. 일정한 시간마다 불을 끄고 재우는 식을 넘어, 아예 울다 지쳐 잠들게 하라는 게 수면 교육의 방법으로 제안되는 게 무슨 의미겠나.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영아의 일주기를 조절하는 데 모유가 관여한다면 어떨까.
천연 수면제 모유의 재발견
럿거스대학교 연구진은 아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조절에 모유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에 주목했다. 그래서 수유 중인 엄마들에게 하루 네 번(오전 6시, 정오, 오후 6시, 자정)에 걸쳐 모유를 채취하게 한 뒤 모유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놀랍게도 모유에 수면 조절에 영향을 주는 두 호르몬이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분포한다는 게 확인됐다. 사람의 잠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코르티솔은 모유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관찰됐다. 오전 6시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뚜렷한 일주기 리듬이 모유에서도 관찰된 것이다. 엄마의 코르티솔이 엄마를 깨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아침을 알리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반대로 밤이 되면 모유는 천연 수면제로 변한다. 모유 속 멜라토닌 농도가 자정에 최고 수준에 도달해서다.
이런 모유 속 호르몬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미숙한 영아의 일주기 리듬 조절을 모유 속 호르몬이 도울 수 있어서다. 아직 자체적으로 일주기 리듬을 조정하는 기능을 못 하는 아이에게 엄마의 성숙한 일주기 리듬이 모유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모유를 먹는 아이는 자연스레 엄마의 생체리듬을 배우고, 이를 통해 밤에 좀 더 쉽게 잘 수 있다. 효과도 불명확한 수면 교육이 없어도, 아이의 일주기 조절을 위한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모유 속에 들어있던 셈이다. 그런데 아이에게 젖을 직접 물리는 게 아니라, 유축을 하는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새벽에 짠 모유를 낮에 먹인다거나, 아침에 짠 모유를 밤에 먹이면 아이의 수면 조절 호르몬이 반대로 엉켜 되레 밤낮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낮모유와 밤모유를 구분해둬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아예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어떨까. 이 아이들은 모유가 제공하는 강력한 생화학적 신호 없이, 오직 빛과 소리 같은 외부 환경 단서에만 의존해 자신의 생체시계를 맞춰가야만 한다. 분유에는 코르티솔이나 멜라토닌 같은 모체가 주는 일주기 신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분유만 먹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수면 교육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모유 수유율이 줄어들고, 분유만 먹이는 아이가 늘어난 게 수면 문제를 겪는 아이가 늘어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사회에서 '모유'를 먹일 시간이 엄마에게 주어지고는 있는 걸까.
모유 권하기만 하는 사회
주변 부모들을 살펴보면 분유 먹이는 걸 단지 개인의 선호라고 보긴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여성을 반기지 않는 직장 문화가 많은 엄마를 너무 이르게 일터로 내몰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모유 수유의 중요성은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아이 곁에서 젖을 물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보장하지 않으니 엄마들은 아이에게 괜한 죄책감만 갖게 되는 일이 잦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를 고려하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출산율 하락의 주된 이유가 둘째 낳는 집이 드물어져서라는 걸 생각하면, 위에서 살펴본 문제를 단순히 아이의 잠투정 문제라고 볼 수만도 없다.
어쩌면 저출생 정책은 거창한 게 아니라 모든 아이가 '밤모유'를 제시간에 먹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당연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