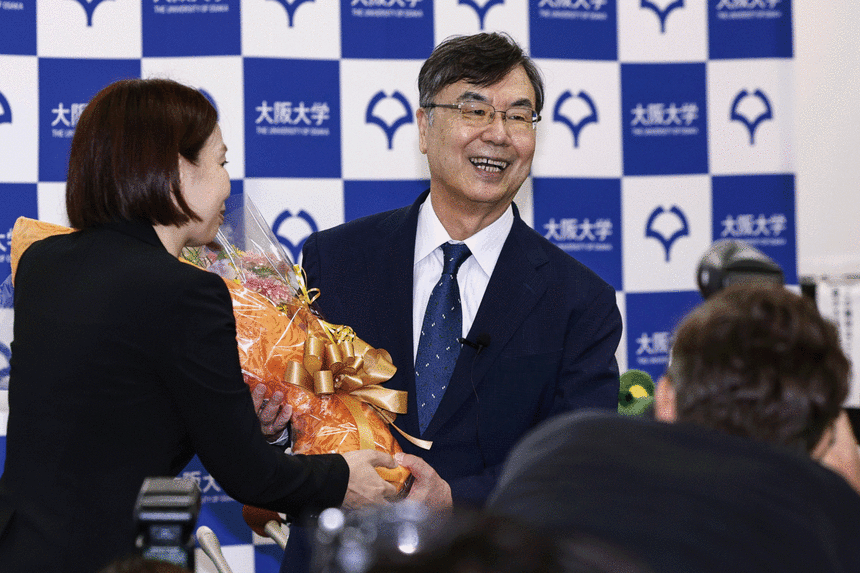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다. 바로 "기초과학이 탄탄해야 노벨 과학상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상을 연구하는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컴퓨터과학자 브라이언 우지 교수는 "노벨위원회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과학자에게 상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노벨 과학상은 기초과학의 중요한 지표다.
물론 응용과학 분야가 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자들이 수상한 2024년 노벨 과학상이다. AI의 대부로 불리며 기술의 토대를 놓은 연구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데 이어, '알파고 쇼크'로 세계를 놀라게 한 AI 개발자들이 화학상까지 거머쥐었다. 이 때문에 올해도 AI를 활용한 혁신적 성과들이 과학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 예상을 깨고 기초과학 분야 연구들이 올 과학상에 모두 선정됐다. 노벨 과학상답게 본래의 취지로 돌아온 셈이다.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오는 반도체·통신 등 응용과학 육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초과학이 탄탄해야 응용과학도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다.
생리의학상, '조절 T세포' 규명한 공로
일본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하며 기초과학 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일본 오사카대 사카구치 시몬(74) 석좌교수는 면역체계의 제어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미국 시스템생물학연구소의 매리 블랑코(64) 박사, 미국 소노마바이오테라퓨틱스의 프레드 램스델(65) 연구위원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차지했다.
3명의 연구자들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막는 경비병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의 존재와 기능을 밝혀내 인류의 질병 극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먼저 사카구치가 1995년 자가면역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새로운 유형의 면역세포인 조절 T세포를 처음 발견했다. 또 보안요원인 이 조절 T세포 때문에 면역체계가 공격해야 할 대상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면역세포 중에는 체내의 정상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잘못 알고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 발생 세포가 있는데, 그 공격 면역세포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새로운 세포군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 2001년 블랑코와 램스델은 조절 T세포의 생성과 자가면역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블랑코는 쥐 실험을 통해 'Foxp3'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조절 T세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자가면역질환에 걸린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램스델은 Foxp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인간에게서도 희귀 난치질환인 'IPEX'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한편 사카구치는 2003년 이 두 발견을 연결해 Foxp3가 조절 T세포의 발달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했다. Foxp3가 망가지면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조절 T세포를 강화하면 자가면역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3명 수상자들의 발견은 면역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며, 왜 대부분의 사람이 치명적인 자가면역질환에 걸리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연구는 향후 자가면역질환, 암 면역, 장기이식 등에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것이다.
노벨 화학상 역시 기초과학 분야가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새로운 형태의 분자 구조인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개발한 교토대의 기타가와 스스무(74) 교수와 호주 멜버른대의 리처드 롭슨(88) 교수,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오마르 야기(60) 교수가 선정됐다. 일본은 이번 2명의 수상자를 포함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이고, 이 중 과학 분야가 27명이나 된다.
화학상, 금속·유기 골격체 개발한 공로
MOF는 금속 이온 사이를 레고처럼 유기 분자로 연결해 만든 결정 구조의 다공성 물질이다. 내부에 수많은 구멍이 있어 스펀지처럼 여러 물질들을 흡착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이때 금속이나 유기물의 종류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장하거나 흡착하려는 물질의 크기를 크게 하고 싶다면 길이가 긴 유기물을 사용하면 된다.
MOF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OF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중립에 일조할 수 있고, 천연가스와 수소 연료를 고밀도로 저장할 수 있고, 대기 중 수분을 흡착해 물 부족이 심한 사막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약물을 체내에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전달체를 만들 수도 있다.
MOF는 1989년 롭슨 교수가 구리 이온에 유기 분자를 결합시켜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정 구조를 만든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결정 구조는 불안정해 쉽게 붕괴한다는 게 단점이었다. 이후 1992년 기타가와 교수가 MOF 안으로 기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을 증명했고, 1995년엔 야기 교수가 MOF의 개념 정립과 설계 원리를 체계화해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체로 만들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MOF를 기반으로 한 실용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물리학상, 양자컴퓨터 원리 입증한 공로
노벨 물리학상은 초전도 회로를 통해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를 규명한 3명의 미국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존 클라크(83)와 예일대의 미셸 드보레(72) 명예교수,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의 존 마티니스(67) 명예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세 과학자는 1985년 초전도체 전기회로 실험을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도 전자가 절연층을 통과하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증명했다. 원래 중첩과 얽힘, 터널링 같은 양자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자나 전자의 세계에서만 일어난다고 인식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두 초전도체 사이에 얇은 절연층을 삽입한 '조셉슨 접합' 구조를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쿠퍼쌍이라 불리는 '전자쌍'이 '에너지 장벽(절연층)'을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즉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의 전기회로에서도 양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양자컴퓨터의 구동 방식이자 기본 단위인 '초전도 큐비트'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이번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과학적 성과보다는 과학의 본질인 원리를 밝히는 데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수십 년간 묵묵히 연구해 왔다는 점이다. 기초과학의 저변이 넓어져야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노벨상급의 '거목'을 키워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도 앞을 길게 보고 미래 기술의 씨앗이 되는 기초과학에 꾸준히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